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문학과 영화가 그려낸 20세기 한국은 비극이다. 군부 쿠데타 정권 찬탈, 이로 인한 유가족 합동영결식 장면은 반복된 그림 중 하나다. 소설과 영화에서 꾸준히 복기하며 길어 올린 현대사 상흔(傷痕)은 사람들 의식 속에 깊게 자리 잡았다. 국회에 침투했던 707부대가 순간순간 머뭇거린 건 이런 영향이 크다.
“여러 밤을 관 앞에서 새운 유족들은 왼쪽 가슴에 검은 리본을 꽂고, 몸속에 모래나 헝겊을 채운 허재비들처럼 느릿느릿 관을 따라 나갔다(중략). 그 과정에서 네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은, 입관을 마친 뒤 약식으로 치르는 짧은 추도식에서 유족들이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관 위에 태극기를 바듯이 펴고 친친 끈으로 묶어놓는 것도 이상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소설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다. 계엄군이 총칼로 무장하고 시민들을 살해했다. 여태 나온 5·18 소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폭도’로 묘사됐던 이들이 태극기로 관을 감싸고,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을 조명한다. 이는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누구였는지, 나라를 생각한 이가 누군지를 명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한낮에 사람들을 때리고 찌르고, 그래도 안되니까 총으로 쐈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들이 명령한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어(중략). 복도 여기저기서 동시에 입관이 치러졌다. 흐느낌 사이로 돌림노래처럼 애국가가 불려지는 동안, 악절과 악절들이 부딪치며 생기는 미묘한 불협화음에 너는 숨죽여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하면 나라란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은 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롬 노벨상박물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집필하기 위해 당시 계엄 상황을 공부했기에 그가 받은 충격은 컸다. 한강은 “바라건대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로(言路)를 막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계엄령이 내려지기 하루 전날, 계엄 하루 전 군 병원서 ‘환자 폭증 상황 대비’ 훈련을 한 정황까지 밝혀졌다. 유혈사태를 대비한 것이라는 점을 다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대테러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제707특수임무단이 국회에 투입된 건 역사의 비극이다. 1979년 신군부 는 12.12 군사반란 당시 하나회 소속 최세창이 지휘하는 제3공수특전여단이 정병주 제3대 특수전사령관을 불법 체포했다. 그 과정에서 부관 김오랑 소령을 사살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마지막까지 바리케이트를 치며 상관을 엄호했던 오진호 소령(정해인 분)이 바로 김오랑 소령이다.
707대대 창설은 반란 수괴들이 만들어냈다. 혹시 자신들처럼 누군가가 또 반란을 일으킬지 두려워 경호 친위대 성격으로 사령관 직할부대를 만들었다. 그들 뜻대로 가지 않았다. 이후 대테러 부대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들은 머뭇거렸다. 국회 전원을 차단하고 테러범을 진압하듯이 명령을 수행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라’란 무엇인가 생각이 몸을 막았다. 맨몸으로 탱크를 막은 시민에게, 총부리 막고 나선 국회 보좌관에게 총을 쏠 수 없었다. 총알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건 무수히 반복된 비극을 반복할 수 없단 의식의 발로다. 계엄군이 저지른 참혹한 역사를 반복할 순 없었다.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달, 계엄령이 내려져 시민을 짓밟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건 한국이 축적해 온 ‘민주화 DNA’ 덕분이다.
정권은 자신이 한 말을 거둬들이고 있다.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던 대통령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폭로가 나오자 발언을 취소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의결할 수 있었겠나”고 말했다가 십자포화를 맞고 말을 주워담았다. 오늘(7일) 오후 5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21세기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느냐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다. socool@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리사, 시스루 세트 룩으로 완성한 페미닌 카리스마... 글로벌 팬덤 사로잡은 다국적 매력과 독보적 퍼포먼스! [이주상의 e파인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2/04/news-p.v1.20251204.10da859a3dc24d3c9b9b5a268163fa4c_P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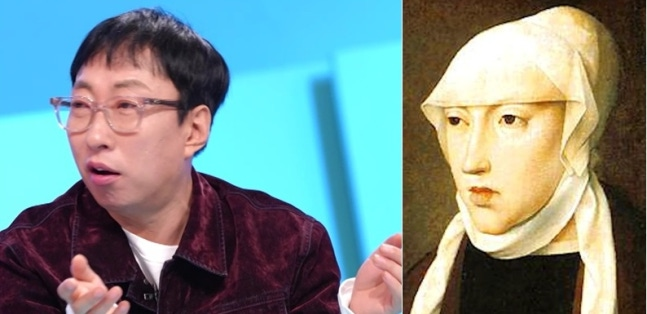








![치어리더 김현영, 비키니 입고 자쿠지 힐링 ‘볼륨감 무슨 일’ [★SNS]](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2/16/news-p.v1.20251216.9941f87275e94378988e487ff5d980db_R.png)
![‘빅리거’ 배출만 5명인 키움, 히어로즈 프랜차이즈 6번째 메이저리거 ‘탄생 임박’ [SS시선집중]](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2/16/news-p.v1.20251209.d8fb806f9783400da249bd021cfff5e2_R.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