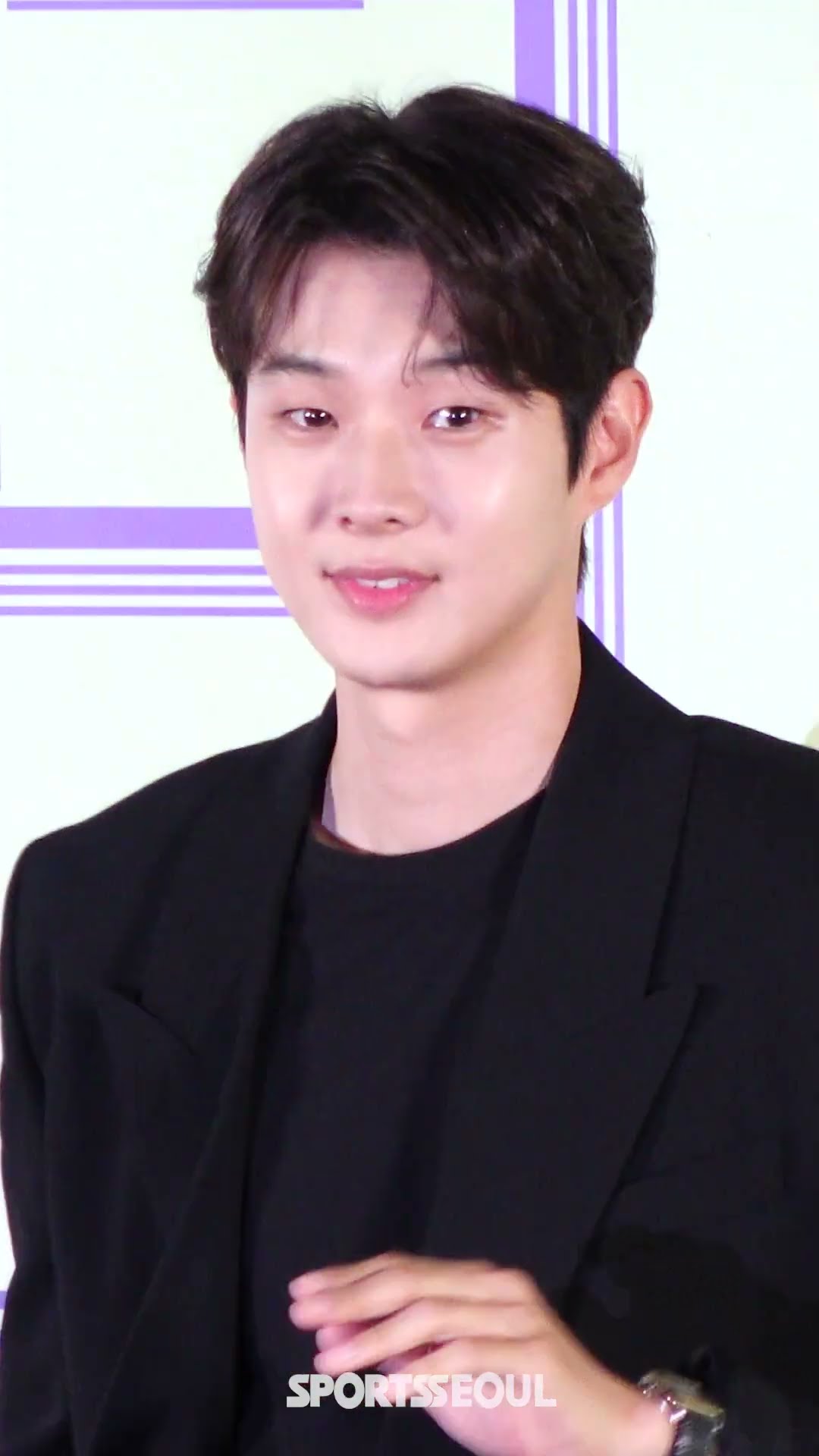[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선전화 설치가 어려웠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휴대폰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과거 단말기와 네트워크 장비를 수입하던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상대 수출국으로 변모했다. 이 배경에는 거침없는 이동통신의 발전이 있다.
한국은 올해 이동통신 40주년을 맞이했다. 그 시간을 거치며 음성 지원에서 가상현실, 홀로그램 시대로 가속 전환 중이다. 특히 AI시대에 ICT(정보통신기술)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할 시점이다.
◇이동통신, 벽돌폰에서 6G시대로의 대전환
1984년 일명 ‘벽돌폰(1G)’이 등장했다. 이동통신의 시작이었다. 1996년 피처폰(2G), 2003년 스마트폰(3G), 2011년 멀티미디어 기기(4G)에 이어 2019년 AR·VR, IoT, 자율주행(5G)으로 발전하며 6G 시대가 목전이다.
국내 통신 시장은 한국전기통신공사(KTA)의 독점 구도에서 현재 SKT, KT, LG유플러스 등 3사 경쟁체제로 바뀌었다.
이동통신의 발전으로 ICT 산업도 커졌다.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신시장 경쟁 구도 개선 △마케팅 경쟁 촉진 △유무선 통신 인프라 고도화도 진행 중이다.
차세대 네트워크(6G)는 올해 표준을 정해 오는 2030년까지 상용화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6G는 AI 기반 대전환 시대를 열어젖힐 촉매제로 평가받는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경제·사회·산업 등 전 분야에 AI의 일상화가 본격 확산됨에 따라 혁신 AI 경쟁력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AI규범, AI·데이터 협력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정했고, 지역·중소기업·디지털플랫폼정부 등 AI 활용도 촉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ICT산업의 황금기 위해 협력적 생태계 필요
한국의 통신산업은 지난 40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마냥 장밋빛 미래를 장담할 순 없다. 2010년대 이후 통신산업의 발전 속도나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평균 3만 원 선의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 하락 후 유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다가올 AI 중심의 세상에는 어떻게 적응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AI 대응은 기업, 산업,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빅테크와 초거대 LLM(대규모언어모델) 모델 경쟁에는 나서기 어렵지만, 적어도 적극적 형태의 방어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그 연장선에서 권 교수는 뒤처지지 않을 대안 확보와 기술변화 모니터링에 힘쓸 것을 조언했다.
한국 ICT산업의 황금기는 1990년대~2000년대 초반이다. 이동통신·인터넷의 급격한 수요와 벤처붐이 산업을 견인했다. 이를 통해 내수 기반 신규시장을 창출했고, 시장공급을 뒷받침할 제조업 경쟁력 및 적극적 인프라 투자가 조화를 이뤘다. 정부의 일관된 산업 활성화 의지 및 후원도 도왔다.
하지만 현재 AI시대를 맞아, ICT 산업의 황금기 재래를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이동통신 중심의 생태계 선순환 고리 회복이다.
그래야만 이동통신 단말기뿐 아니라, 콘텐츠 및 인터넷 서비스까지 덩달아 발전하며 산업 전체의 생태계 발전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통신사별 대립 구도를 벗어나 통신, 기기, 플랫폼, 콘텐츠까지 아우르는 협력적 생태계 구도가 절실하다. gioia@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단독] 클릭비 노민혁, 띠동갑 베트남 여성과 결혼 전제로 열애](https://file.sportsseoul.com/svc/desking/1000/index/202405/A1425997_4_2024050708065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