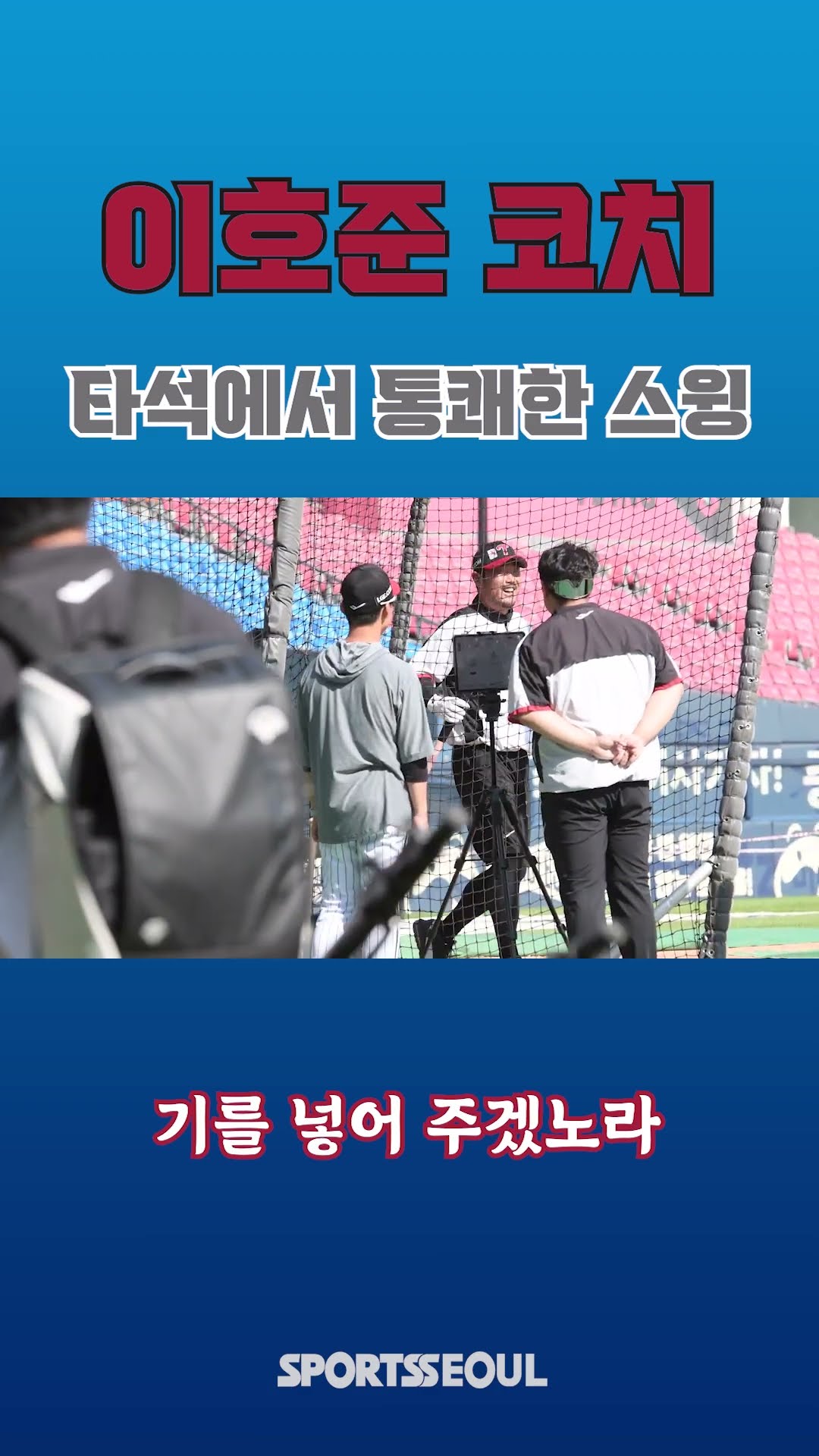|
[스포츠서울 고진현기자]세상 일이 무 자르듯 썸뻑 자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논리와 명분 그리고 원칙을 따지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정작 문제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맞물릴 때면 슬쩍 다른 잣대를 내밀곤 한다. 자신의 이익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능적 행동양식이겠지만 공적인 업무에선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살타래처럼 꼬인 갈등관계를 슬기롭게 풀어내는 게 모름지기 리더가 해야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최근 큰 시험대 위에 올라있다.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중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하는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가 지난 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협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원칙에 따라 대한체육회 승인조항 삭제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회장을 포함한 임원 승인권을 비롯해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에 관한 대한체육회 승인권을 없애는 축구협회의 결정은 체육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체육회는 당장 반발했다. “축구협회는 다른 회원종목단체와 같이 체육회가 요구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정관개정을 강행할 경우 스포츠토토기금을 비롯한 예산지원을 삭감하고 체육회 대의원 자격박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체육회의 반발 논리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뛰어난 마케팅 능력을 앞세운 축구협회가 탄탄한 물적토대를 바탕으로 안정된 기구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고와 기금을 지원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관리 감독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연맹(IF)이 요구하는 자율성을 이유로 체육회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려는 축구협회의 사례가 다른 종목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그렇게 되면 국내 체육질서가 어지러워질 수도 있고,문제 인사를 걸러내는 필터링 기능마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기에 앞서 한 번쯤 되돌아볼 점도 없지 않다. 바로 통합체육회가 출범한 지난해의 일이다. 정부 주도의 체육통합에 반발했던 체육회가 통합준비위원회가 만든 정관 가운데 유독 독소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안은 무엇이었을까. 축구협회가 주장한 것과 똑같은 자율성의 문제였다. 체육회는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회장 및 임원 승인권을 IOC헌장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이러한 의지는 지난 4월 개정 정관에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상급기관의 임원 승인권을 처한 입장에 따라 달리 말하는 건 넌센스다. 체육회는 시쳇말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의 딜레마에 빠졌다. ‘갑’의 입장에선 철저하게 반대하면서 ‘을’의 입장에선 이를 관철시킨 우스꽝스런 사태다. 짧은 시차를 두고 본질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다른 잣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건 그야말로 모순이다.
체육회가 맞닥뜨린 고차방정식은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답을 내기 힘들다. 상충되는 두 가지의 사안을 가치 문제로 해결하기 힘들 경우, 이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푸는 게 옳다. 논리적으로 자기모순의 함정에 빠진 체육회로선 정치력을 발휘해 축구협회와 머리를 맞대고 접점을 찾아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아쉬운 점은 오직 하나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대한체육회 부회장인 만큼 왜 일이 불거지기 전에 체육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 점에 있어서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과적으로 한국 체육을 슬기롭게 이끌어야 할 두 사람이 체육계의 혼란만 부추긴 셈이다.
한국 체육은 현재 ‘시계(視界) 제로’다. 체육에서 시작된 최순실의 국정농단 후유증을 아직 치유하지 못했고, 지난해 체육단체 통합과정에서 드러난 ‘관치체육’의 그림자도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선 큰 흐름을 읽어내고 다가올 악재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슬기로운 리더십이 절실하다. 최근 한국 체육을 위기라고 진단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다.
부국장 jhkoh@sportsseoul.com
기사추천
3






![[단독] '골때녀' 미녀 개그우먼 김승혜, 동료 개그맨과 결혼 전제 열애](https://file.sportsseoul.com/svc/desking/1000/index/202405/A1424823_4_202405021331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