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대한축구협회는 한국 축구 최상위 행정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축구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겐 한 번 쯤 일해보고 싶은 ‘로망’ 같은 존재다. 한편으론 각종 국제대회 등에서 한국 축구 성적이 부진하거나, 축구 관련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동네북’ 기관이기도 하다. 선수,지도자,심판,산하연맹,시.도축구협회,프로구단,에이전트,언론 등 축구판엔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단체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이들 모두 대한축구협회를 떼어놓고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스포츠서울은 경기단체 해부 시리즈 3탄으로 대한축구협회를 3차례에 걸쳐 준비했다.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과 고민,해결과제,과거 현재 미래 등을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대한축구협회엔 누가 입사하는가
지난 해 초 대한축구협회는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했다. 5명 채용에 몰린 이들은 총 190명으로 경쟁률은 38대1. 매년 하는 공채가 아니다보니 ‘축구 행정가’를 꿈꾸는 젊은이들 열기는 대단했고, 실제로도 이른 바 ‘스펙’ 좋은 이들이 몰렸다. 유럽 빅리그 구단 한국인 직원도 서류전형에서 낙방할 정도로 경쟁은 치열했다. 이때 입사한 홍보실 안효진씨는 “실력 있는 인재들이 면접장에 많이 나타나, 최종 합격했을 때 더 기뻤던 것 같다”고 1년 전을 돌아봤다. 2022 월드컵 유치위원회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그는 영어와 일어에 능통해 2013 동아시안컵 일본대표팀 기자회견 통역도 담당하는 등 축구계와 계속 인연을 맺었다. “동기 중엔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근무 중이던 이도 있고, ‘홍명보호’ 네덜란드 출신 안툰 코치 전담 통역을 하다가 공채에 지원해 채용된 경우도 있다”는 게 안씨 설명이다. K리그 한 구단 중견급 직원은 “축구 행정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한축구협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꿈꾼다”며 “조직 문화를 떠나,대표팀과 함께 숨을 쉬며 한국 축구 변화를 리딩할 수 있다는 곳이라는 사실은 꽤나 매력적”이라고 전했다.
◇프로구단에 직원 뺏길 때가 있었다
그런 축구협회도 인력 유출로 골머리를 앓던,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들 때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1년 8월 스포츠서울을 비롯한 스포츠전문지에 대한축구협회 채용 공고가 게재될 때가 그랬다. 당시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수장으로 있던 시절이었다. 1990 이탈리아 월드컵 직후 축구협회 직원들이 프로 구단으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행정 공백이 생긴 것이다. 그 때 입사했던 이해두 현 마케팅실장은 “개인적으론 축구 선수를 꿈꾸기도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 갈 기회를 포기하고 축구협회를 선택했다”며 “와서 보니 버스기사, 건물 관리인 등을 포함해 직원이 20명에 불과했다. 김 회장이 있던 대우그룹은 최고의 직장이었지만 축구협회는 달랐다. 근무 환경과 급여가 열악해 선배들이 프로 구단으로 간 게 이해가 됐다”고 회고했다.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주무였던 이 실장은 체계적이지 못했던 업무 분장으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다 쓰러지고는 대회 도중 귀국길에 올라 입원하는 아픔도 겪었다.
◇정몽준→조중연→정몽규…인사 변화는?
이 실장은 “그래도 금융이나 증권 상사 등 1990년대 정점을 찍었던 인기 직업들과 달리, 축구는 미래가 보여 참고 기다렸다”고 털어놨다. 그의 말대로 ‘김우중 시대’가 끝나고 1993년 ‘정몽준 시대’가 출범하면서 축구협회는 양과 질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3년 10월 ‘도하의 기적’으로 한국 축구가 미국 월드컵 본선티켓을 거머쥐고 2002 월드컵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면서 축구협회는 예산과 인력 면에서 수준을 높여갔다. 직원은 100명을 초과하면서 20년 사이 5배를 훌쩍 넘겼다. 1993년 65억원이던 예산은 2004년 334억원을 넘어 지난 해 936억원을 기록, ‘1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인력난도 이제 찾아볼 수 없다. 2002 월드컵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하던 1990년대엔 정몽준 회장이 오너로 있던 현대중공업에서 파견된 인재들이 국제 분야를 중심으로 많이 배치됐고 자연스럽게 축구협회 ‘맨 파워’도 상승했다. 2009년 조중연 전 회장 취임 이후 현대중공업 출신들이 ‘원대 복귀’하면서 지금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를 늘려나간 축구협회 자체 직원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정몽규 회장이 2년 전 온 뒤엔 한국프로축구연맹 직원이나 외부 경력 직원들도 중견급에 스카우트됐다.
◇“신이 숨겨둔 직장” vs “언제나 ‘을’인 감정노동자”
축구협회가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적잖게 불거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축구계에 떠도는 “축구협회는 신이 숨겨둔 직장이다”란 표현이다. 20여년간 꾸준히 발전한 끝에, 지금은 축구협회 직원들이 글로벌 대기업 못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정이나 서비스 수준은 그에 어울러지 않으며, 오히려 ‘조직 논리’에 갇혀 축구인보다는 직원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신이 숨겨둔 직장”이란 표현 속에 숨어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를 하다가 2013년 1월 축구협회 수장으로 온 정몽규 회장도 취임 직후 “축구협회 직원들에게 ‘우리는 서비스 단체’라는 말을 했다. (축구협회가)불친절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요즘 상급.하급이 어디 있나”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축구협회 직원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외부에서 쉽게 생각하는 낭만적인 모습보다는 온갖 사람들의 민원 처리에 시달리는 고된 일이 많다는 뜻이다. 박진후 노조위원장은 “‘신이 숨겨둔 직장’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밖에서 축구협회를 바라보는 분들은 ‘경기만 잘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협회 직원들은 감정 노동자와 비슷하다”며 “전체 업무 중 민원이 60%에 달하고, 등록실 직원은 하루 종일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전화만 받다가 제 때 퇴근도 못할 때가 있다. 지도자와 학부모,팬,언론 등 모두에게 화풀이 대상이 되고 고소 협박을 당해도 맞대응할 수 없는 ‘을’ 같은 존재가 바로 축구협회 직원”이라고 항변했다. 한국 축구 발전과 축구협회 성장에 직원들의 노고를 빼놓을 수 없다는 뜻이다.
김현기기자 silva@sportsseoul.com
기사추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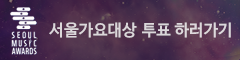




![‘조재현 딸’ 조혜정, 칸 빛낸 핑크빛 드레스 자태…감출 수 없는 볼륨감 [★SNS]](https://file.sportsseoul.com/svc/desking/1000/index/202505/A1512590_9_2025050410151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