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정다워기자]“VAR 시스템은 난장판이다.”(앨런 시어러)
비디오판독시스템(VAR)을 둘러싼 축구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진다. 축구 종가 잉글랜드가 특히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축구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이번 시즌 FA컵에서 처음으로 VAR을 활용하고 있다. 첫 선을 보인지 얼마 안 됐지만 논란거리가 많다. 지난 18일 맨체스터유나이티드와 허더즈필드전에서 후안 마타가 골을 넣었는데 주심이 VAR 판독을 통해 오프사이드를 선언, 골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삐뚤삐뚤한 선으로 오프사이드를 보여주는 그래픽이 송출됐다. 보는 사람 입장에선 황당한 장면이었다. 이후 VAR 담당 업체가 그래픽 실수를 인정해 사과했다. 같은 날에는 주심이 VAR 심판진의 비디오판독 사인을 무시해 문제가 됐다. 첼시의 알바로 모라타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에게 명백한 반칙을 당했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모라타가 시뮬레이션을 했다며 옐로카드를 꺼냈다. 이 장면을 본 잉글랜드 축구의 전설 시어러는 “누가 봐도 반칙인데 심판 혼자 무시했다. VAR 시스템은 난장판이다”라며 비디오판독이 오히려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잉글랜드에서만 VAR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는 건 아니다.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서는 지네딘 지단 레알마드리드 감독을 비롯해 루카 모드리치 등 주요 선수들이 VAR을 비판했다.
VAR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K리그는 이미 지난해 중반부터 시작했다.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축구 선진국에서도 VAR을 선택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오심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K리그는 2017년 VAR을 통해 총 43개의 오심을 잡아냈다. 경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면에서 판정을 정정해 호평을 받았다. K리그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전 세계 모든 리그에서 오심이 나온다.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등 빅리그도 마찬가지다. 심판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한계가 있다.
지적한 대로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경기가 1, 2분 가량 중단돼 경기 흐름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앞선 사례처럼 주심이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공정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오심을 줄일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VAR이다. 인간에게 100% 의존하면 대안은 없다.
FIFA는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VAR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복수 외신에 따르면 도입이 확정적이다. 이미 연령대 월드컵과 클럽월드컵 등 국제 이벤트를 통해 시범 운영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3월 국제축구평의회(IFAB) 회의를 통해 결론이 날 예정이다. 월드컵에서도 매번 오심이 나온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세계 최대의 축제가 판정 논란으로 얼룩지는 것을 방지하는 게 VAR의 목표다. 결국 철저한 교육과 매끄러운 운영이 수반돼야 한다. K리그도 처음에는 혼란을 겪었지만 빠르게 정착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인간의 판단과 기계의 정밀함이 만드는 시너지 효과를 월드컵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 weo@sportsseoul.com
기사추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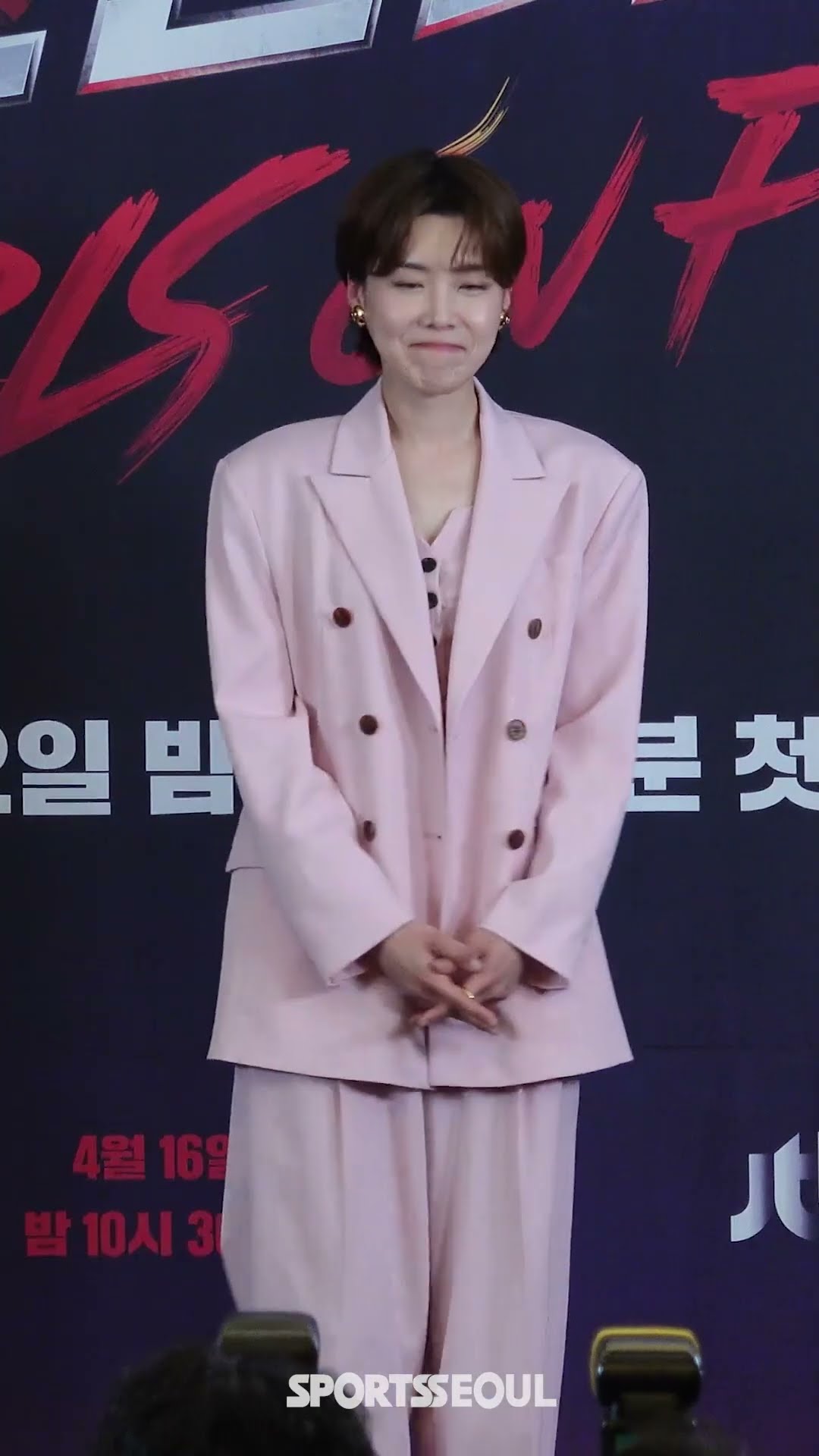



![‘키움 엔트리 등록·말소’ 유심히 들여다 본 KT 이강철 감독 “우리팀 오면 되는데” [백스톱]](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4/04/16/news-p.v1.20240402.f56d19d2255c4e309c55194e33ca1b53_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