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김현기기자]“귀화 선수는 없습니다. 우린 하나의 팀입니다.”
한국에선 동계올림픽의 꽃이 쇼트트랙이나 피겨일테지만 세계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르다. 북미와 유럽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스하키가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한국의 아이스하키 실력이나 저변이 아직 세계 수준과 거리가 멀다는 뜻도 된다. 그런 격차를 한 걸음씩 좁히는 이가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남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을 맡아 2년 넘게 지도하고 있는 백지선(50) 감독이 그 주인공이다. 그가 온 뒤 한국 아이스하키는 많이 달라졌다. 아이스하키대회에선 경기 뒤 승리팀 국가가 울리는데 지난 3월 폴란드 세계선수권(2부)에선 34년 만에 일본을 누르며 애국가를 울렸다. 지난 11월 유로챌린지에선 헝가리 덴마크 폴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 중상위권 국가들과 싸워 적지에서 우승하는 기염도 토했다. 신년 인터뷰를 위해 스포츠서울과 만난 백 감독은 “실력도 발전됐으나 팀의 문화나 정신력이 나아지고 있다. 항상 모이고 훈련하면서 발전하는 중”이라고 자평했다.
◇“귀화 선수의 팀? 우린 하나의 팀이다”‘백지선호’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 중 하나가 바로 귀화 선수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지난 2012년 브락 라던스키를 시작으로 총 6명의 귀화 선수를 뽑아 현재 대표팀에 넣었다. 이들 모두 안양 한라나 하이원 등 국내 구단에 속해 뛰고 있다. 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대표팀 엔트리는 총 25명인데 이 중 22명이 각 경기마다 뛸 수 있다. 백 감독은 “귀화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에 배우고 반대로 한국 선수들은 귀화 선수들에 배운다”며 대표팀이 귀화 선수 중심이라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을 보자. (주공격수인)마이크 테스트위드가 1차전에서 무릎 인대 파열로 이탈했으나 한국 선수들이 그의 공백을 메워 일본도 이기고 1부 승격 문턱까지 갔다”며 “귀화 선수가 다쳐도 잘 이겨냈다. 1~2명이 빠져도 서로 도와 승리했다”고 설명했다.
백 감독이 강조하는 것은 ‘컬처, 팀 문화’다. 귀화 선수는 이제 아이스하키의 일반적인 현상 중 하나지만 한국대표팀은 이를 ‘따로따로’가 아닌 한솥밥에 담아냈다는 뜻이다. 백 감독은 “프랑스 등 유럽 대표팀엔 캐나다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살고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에서 뛰는 선수들이 즐비하다. 대표팀 경기 때만 프랑스 소속으로 온다”며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그들(귀화 선수들)은 한국에서 살고,한국에서 뛰며,한국 선수들과 같이 놀고 같은 음식을 먹는다. 한국 여자친구를 사귀기도 한다(웃음)”며 ‘하나된 팀’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표팀이 이동할 땐 정장을 갖춰 입는 것 역시 그렇다. 그는 “트레이닝복에 슬리퍼 끌고 다니는 모습이 좋은가. 대표팀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장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
◇“재미있고 다이나믹한 하키, 우린 할 수 있다”
백 감독의 부임 이유는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이다. 정몽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은 지난해 “평창 올림픽 목표는 8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누군가는 “올림픽에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한 한국이 세계적 강호 12팀 중에 8위 안에 든다는 게 현실적이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으나 대회 방식을 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평창 올림픽 아이스하키는 12개팀이 4개팀씩 3개조로 짜여 조별리그를 치르는데각 조 1위 3개팀과 각 조 2위 중 성적이 가장 좋은 한 팀이 8강에 직행하고 나머지 8팀은 두 팀씩 짝을 지은 뒤 플레이오프를 통해 나머지 4장의 8강 티켓을 가린다. 디펜딩 챔피언 캐나다를 비롯해 체코 스위스 등 강호들과 한 조에 속한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비록 전패를 하는 일이 벌어져 4위를 한다고 해도 다른 조 2위 혹은 3위팀과의 플레이오프에서 이기면 8강이 가능하다. 지난 2014년 소치 올림픽 땐 라트비아가 조별리그 꼴찌임에도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해 결선 토너먼트까지 갔다.
백 감독은 8강 얘기를 듣자 “환상적인 목표다. 꼭 하고 싶고 누구에게 지고 싶지 않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하지만 “지금 어떤 성적을 보장할 순 없다. 최대한 높이 가고 싶지만 세상에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신중함도 잃지 않았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 아이스하키의 놀랄 만한 발전이다. 거스 히딩크 감독이 2002 한·일 월드컵 50일 전 “지금 50%인데 매일 1%씩 끌어올려 개막 때 100%를 만들고 싶다”고 한 것과 비슷하다. 태어난 지 1년 만에 캐나다로 이민을 간 그는 1991년 아시아인 최초로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에 데뷔했으며 그 해와 이듬 해 NHL 우승으로 스탠리컵을 들어올린 스타 출신이다. 2005년부터 14년까진 NHL 하부인 AHL에서 오랜 기간 지도자 생활을 했다. 히딩크가 2002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대표팀을 끌어올리기 위해 온 것처럼 백 감독도 평창 올림픽에서의 한국 아이스하키의 업그레이드 사명을 받아들고 모국을 찾은 셈이다. 백 감독은 “항상 모이고 훈련하면서 매일 나아지고 있다”며 “금메달과 승리도 중요하지만 아이스하키는 재미있고 다이나믹한 스포츠다. 꼭 재미있고 감동 있는 경기를 펼쳐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평창 올림픽 경험을 한 선수들이 은퇴 뒤 어린 선수들에게 이 경험을 꼭 전수한다면 더 나은 미래가 드러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silva@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단독] '배용준♥' 박수진, 하와이 거주 중인데 갑자기?...계약 해지](https://file.sportsseoul.com/svc/desking/1000/index/202404/A1420083_4_2024041808101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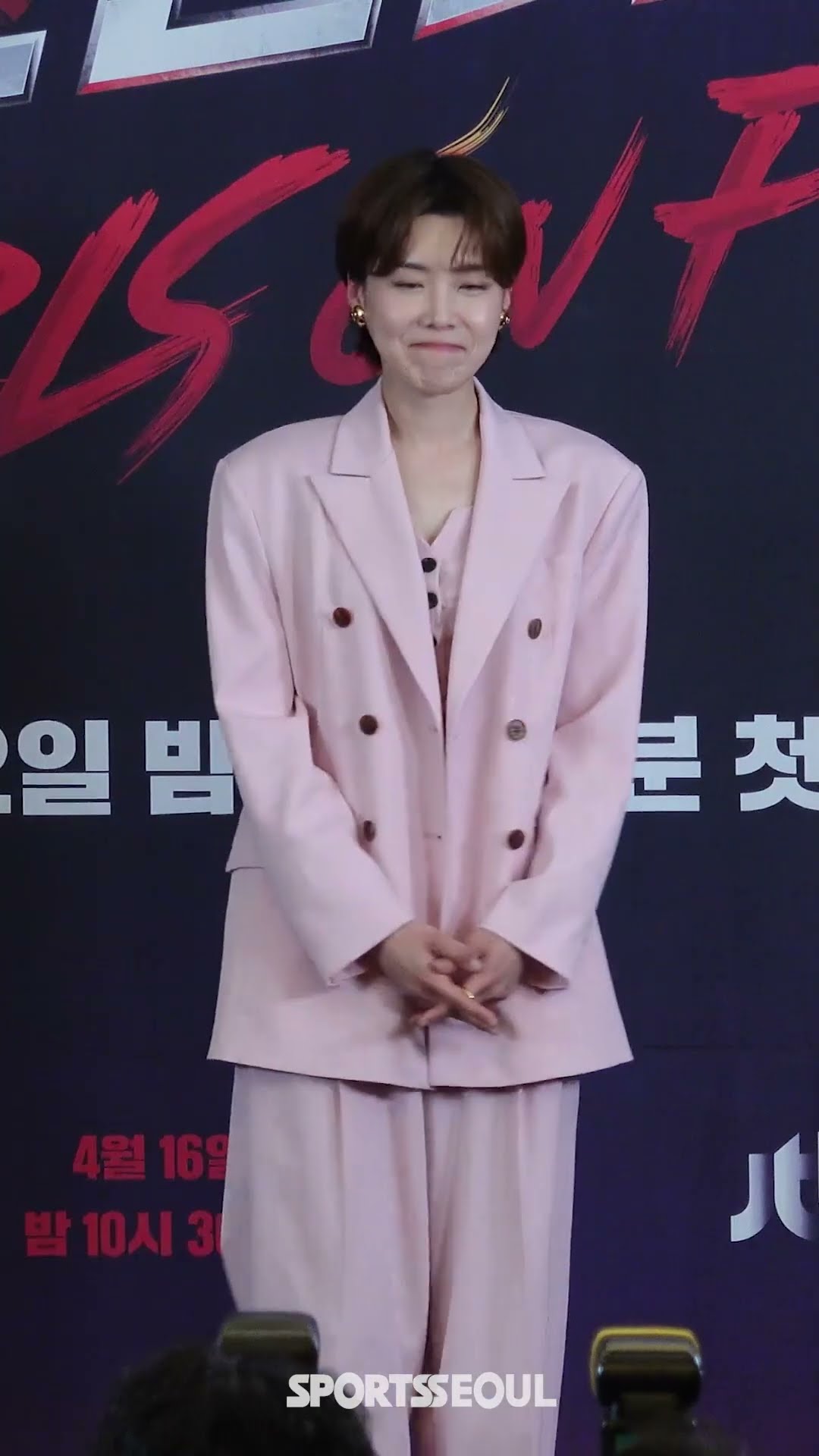


![‘키움 엔트리 등록·말소’ 유심히 들여다 본 KT 이강철 감독 “우리팀 오면 되는데” [백스톱]](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4/04/16/news-p.v1.20240402.f56d19d2255c4e309c55194e33ca1b53_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