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도형기자] 프로야구는 이제 우리나라에선 없어선 안 될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올 시즌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800만 관중을 돌파했고, 포스트 시즌(PS)도 연일 만원 관중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야구를 향한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야구 관련 기사들도 매일 수백 개씩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 독특한 이력의 기자 출신 해설위원이 있어 눈길을 끈다. 국내 기자로는 처음으로 미국 프로야구(MLB), 일본 프로야구(NPB), 한국 프로야구(KBO)를 모두 경험한 박승현 MBC SPORTS+ 해설위원이 그 주인공이다.
90년대 초 국내 최고의 대기업을 그만둔 뒤 한 일간지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한국, 일본, 미국의 야구를 체험하면서 느끼고 배운 걸 바탕으로 올 시즌 메이저리그 해설위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메이저리그도 이제 월드시리즈(WS)만을 남겨둔 가운데 그를 만나 현지 취재 중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와 코리안 빅리거들의 활약에 대한 소회를 들어봤다.

올 시즌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 이대호(시애틀 매리너스) 등이 새롭게 메이저리그의 꿈을 이뤘다. 여기에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메이저리그를 향한 국내 야구 팬들의 관심은 어느 시즌보다 뜨거웠다.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도 한 몫 했다.
다소 낯선 환경이지만 한 시즌 동안 현장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중계를 하며 이들을 지켜본 박 위원은 먼저 좋은 성적을 거둔 김현수, 오승환의 이야기부터 꺼냈다. 그는 "예전에 미국에서 롯데 자이언츠 제리 로이스터 전 감독을 만났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선수로 김현수를 꼽더라. 시즌 초반 마음 고생이 있었지만 잘 해낼 거라 믿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오승환의 신인 시절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2005년 삼성 라이온즈에 있을 때 오승환을 본 적이 있다. 한국시리즈 우승 후 일본으로 건너가 소프트뱅크 호크스와 아시아 시리즈를 치를 때였는데, 일본 기자들이 오승환의 공을 보고 '저 선수는 FA가 언제냐'고 묻더라. 그만큼 구위가 좋았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박 위원은 또 "이렇게 한국과 일본을 접수한 오승환이지만 메이저리그는 확실히 기량 차이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지켜봤다. 그런데 부담감을 이겨내고 당당히 팀의 한 자리를 차지하더라. 오승환의 별명이 '파이널 보스(Final Boss)'가 된 것만 봐도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대호와 추신수에게는 조금은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먼저 이대호는 메이저리그 갈 때 계약이 아쉬웠다. 한국과 일본을 평정한 선수가 연습생 대우로 계약을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본다. 그 자체가 대단하다. 꾸준히 기용만 됐으면 더 좋은 성적을 거뒀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전했다.

"추신수는 올 시즌 스프링캠프 때 지켜보기도 했는데 '지난해와 다르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준비를 철저히 한 걸로 느껴졌다. 그만큼 올 시즌 활약이 기대됐는데 부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내년엔 좀 더 잘할 거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정호 선수에 대한 평가는 남달랐다. 박 위원은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진출 때부터 잘 할 줄 알았다. 타격 메커니즘이 빠른 공을 던지는 MLB에 적합한 타자다. 앞으로도 부상만 없으면 꾸준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내년시즌에도 피츠버그 중심타자로서 맹활약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뉴미디어국 wayne@sportsseoul.com
사진=스포츠서울 DB, 김도형기자 wayne@sportsseoul.com
기사추천
7














![[단독] '배용준♥' 박수진, 하와이 거주 중인데 갑자기?...계약 해지](https://file.sportsseoul.com/svc/desking/1000/index/202404/A1420083_4_2024041808101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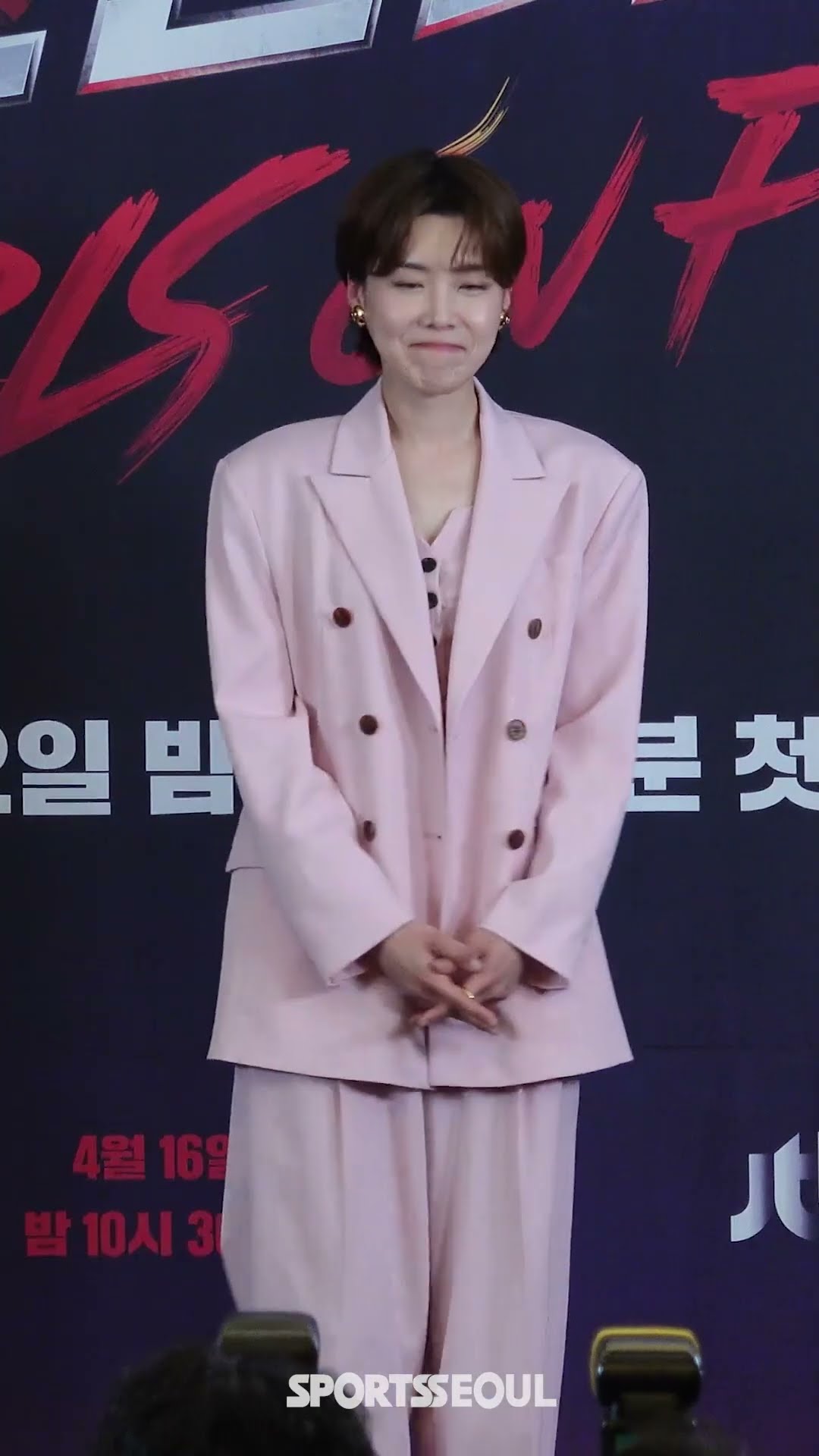


![‘키움 엔트리 등록·말소’ 유심히 들여다 본 KT 이강철 감독 “우리팀 오면 되는데” [백스톱]](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4/04/16/news-p.v1.20240402.f56d19d2255c4e309c55194e33ca1b53_R.jpg)